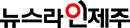감나무집은 우리 집과는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이다. 한데 며칠 전부터 그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식구들도 통 보이지 않았다. 하루는 건축업자인 그 집 아저씨가 조립식 주택을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걸 본 후에야 나는 뒤늦게 그 가족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집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조립식 주택은 모두 철거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신축이 들어서는 줄 알았다.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철거 폐기물이 말끔히 치워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덤프트럭이 몇 차례 흙을 실어날랐다. 이어서 포크레인이 군데군데 산더미처럼 쌓인 흙무더기들을 퍼 나르며 집터와 마당과 텃밭까지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너른 땅을 골목 도로와 같은 높이로 맞추려고 그런 작업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 만약 그 자리에 멋진 신축 건물이 지어진다면 동네 골목이 한결 환하게 밝아질 것 같아 내 기분이 은근히 좋아지면서 강한 호기심도 일었다. 과연 어떤 주택이 지어지게 될지 몹시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집도 낡아서 언젠가 때가 되면 철거해버리고 신축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던 터라 관심이 더 많았다. 하지만 다음 날,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공사가 모두 끝난 그곳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주 잘 정돈이 된 밭으로 변해 있었다.
감나무집은 일곱 식구가 살고 있었다. 네 명의 아이들과 부부, 할머니 한 분이었다. 마당 입구 한쪽에는 커다란 검둥개가 있었고 내가 그 앞을 지나칠 때면 개는 항상 컹컹 소리를 짖어댔다. 또 나이가 많은 그 집 할머니는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오일장에서 팔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미나리 한 바구니를 우리집 연못물에서 씻었다. 그러다가 나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할머니는 빙긋이 웃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연못은 백 년도 넘었고,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했으니 나중에라도 연못을 메우지 말라는 신신당부의 말이었다. 만약에 연못을 메워버리면 벙어리 자손이 태어난다고 말이다.
우리가 처음 이곳으로 이사 올 때만 해도 감나무집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아들이 둘, 딸이 둘이었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 집 강아지를 무척 귀여워해서 종종 우리 집 앞마당으로 놀러 왔었다. 그러고는 묶인 강아지 줄을 풀어버리곤 함께 뛰어다니며 놀았다. 그럴 때면 동네 골목이 야단법석이었다. 강아지는 아이들을 뒤쫓았고, 아이들은 술래잡기라도 하듯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몸을 피하며 까르륵 웃으며 강아지와 장난치며 놀기를 좋아했다.
그런 어느 날, 그 집 아저씨가 우리에게 개를 풀어놓지 말라고 짜증을 내자 내가 묶인 개 줄을 풀어버리는 건 그 집 아이들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뒤부터 감나무집 아이들은 우리집 앞마당으로 놀려오지 않게 되었다. 대신 저들끼리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를 타면서 신나게 놀았다. 그러다가 날 보면 아이들은 해맑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그렇게 골목은 늘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집 아저씨는 술을 자주 마시는 듯했고, 간혹 술에 취하면 골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게 영 보기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 아저씨와는 그다지 소통하면서 지내고 싶지가 않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집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 그 동생들도 많이 성장했다, 그러고 보면 그 집은 아이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시내 쪽으로 이사 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이웃이었던 감나무집이 영영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일까, 그 빈 터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허전함과 쓸쓸함이 쉽사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내 귀에 아련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까르륵 웃음소리. 컹컹 짖어대던 검둥개와 연못에서 미나리를 씻으며 빙긋이 웃던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그 가족들이 떠난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라곤 돌담을 기대어 위태롭게 서 있는 키가 큰 앙상한 감나무뿐. 저 감나무도 지금 내 마음처럼 옛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따라 그 아이들의 모습이 한층 더 그리워지자 나는 한참 동안 골목길에서 우두커니 선 채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속담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