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가을에는 부모님과 형들이 꼴을 베러 목장에 가게 된다. 그런 날에는 동생 근식이(일곱살), 광식이(네 살), 안식이(두 살, 만 한살이 못 되어 기어다니는 젖먹이)까지 아홉 살인 내가 총책임자가 되어 모든 걸 관장해야 한다. 안식이는 기어 다니며 닭똥을 주워먹을까 염려해야 되고, 돼지는 먹이를 달라고 우리 너머로 주둥이 내밀며 소리지르지, 안 주면 우리 밖으로 뛰쳐나오니 때 맞추어 구정물과 보리겨를 섞어서 주어야 하고, 바글거리는 닭떼도 모이를 주어야 했다. 잠깐 한눈 팔면 닭들이 집안으로 들어와 마루 부엌 할 것 없이 발자국을 내고 다니며 똥을 싸니 부지런히 내쫓고 똥을 닦아내야 한다. 게다가 새벽녘 첫닭 울 때쯤 어머니는 꼴밭으로 가시면서 ‘식사하고 나서 날이 밝으면 설거지도 하라’고 하신 말씀까지 있어 잠시도 쉴 수 없게 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게 되면 사고가 생기고 특히 어린 동생이 다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엄마에게 벌을 받는다.
한번은 아기를 옆에서 지키라고 동생에게 타일러 놓고 설거지하고 나서 앞밭에서 고구마 넝쿨을 잘라다가 돼지우리에 넣어주라는 어머니의 명을 이행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동쪽집의 할머니에게서 낫을 빌려 고구마넝쿨을 한껏 베어 어깨에 메고 앞만 보면서 오는데 왼쪽 정강이가 서늘했다. 살펴 보니 오른쪽 손에 쥐어진 낫에 왼쪽 정강이살이 움푹 베어져 있었고 종아리가 피투성이였다. 그제서야 으앙 울음을 터뜨리며 집에 달려와 헝겊 가져오라고 근식이에게 시켰지만 어물거리니까 나는 화가 나서 발길질을 했다. 헝겊 조각을 찾아내어 대강 흐른 피를 훔치고 상처난 곳을 졸라매고 나서 고구마줄을 돼지에게 주고 또 닭에게 모이를 줬다. 왼손으로는 아기를 안은 채 모이를 뿌려 주는데 병아리와 어미닭이 앞다투며 몰려오는게 재미 있었다. 긴 몽둥이로 탁 내려치면 닭들이 펄쩍 뛰며 놀란다. 꼬꼬댁하며 저만치 물러갔다가 다시 모여든다. 재미가 있어 이번엔 좀 세게 쳤더니 그 중에 한마리가 파드득거리며 팽팽 돌아 나둥그러지는게 아닌가.
재수없는 닭이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은 것이었다. 겁이 덜컥 났다. 저녁 때, 어머니께 매맞을 생각을 하니 숨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 뒤 양하밭에 숨겨 놓고, 광식이에게 절대 어머니께 말하지 말라고 타일러 놓았다. 신신 부탁을 해 놓고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었다.
그 날은 달이 밝아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자 광식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끄는 것이 아닌가. 아뿔싸,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뒷간에 앉아 변을 보는 체 하며 상황을 지켜 보고 있었다. 광식이가 닭을 숨겨 놓은 곳으로 어머니를 안내하더니 어머니는 닭을 들고 마당으로 왔다. 동생은 태식이가 몽둥이로 두들겨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일러바치는 게 아닌가. 하늘이 노랬다.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우신조인가 내가 다리 상한 것과 여러 가지 심부름해 놓은 게 참작이 되어서인지 큰 벌은 면하고 넘어갔다. 정말 그 때를 생각하며 지금도 가슴이 뜨끔해진다. 그 후로는 그런 사고를 낸 적이 없다.
1940년대 시골에서는 우유라는 것을 보기는커녕 말유우라는 말조차 없는 시절이므로 오직 모유로만 아기를 기르던 때다. 모유말고는 아기들의 양식은 곤밥(쌀밥)뿐이었다. 아침에 보리밥을 지으면서 보리밥 위에 쌀 한 줌쯤 따로 넣어 익힌 것이 곤밥이다. 별도의 그릇에 담아 두고 꼭 아기에게만 먹이라는 게 어머니의 엄명인지라, 나는 먹고 싶어도 참느라고 성가시었다. 곤밥도 그대로 주면 소화가 안 되니 입에 넣어 잘잘하게 씹고 침에 섞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먹여야 했다. 비위생적일지는 몰라도 당시엔 그 방법이 최선이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침에는 소화효소가 섞여 있는게 아닌가. 그 효소가 소화를 도와 아기가 탈나는 것을 예방 한 것 같다.
<저작권자 © 뉴스라인제주(http://www.newslinejeju.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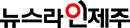

그때 아버지들은 왜 그리 무서웠던지?
사실 일도 엄청 많았지. 나무하러 어승생까지 걸어서 왕복 !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