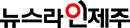어쩌다가 어느 업소의 탁자에서, 이 고장의 모 문예작가회가 발간한 문집을 보게 되었다. 뭐 눈엔 뭐만 보이더라고 “조” 아무개 씨의 수필 속에 한시 세 수가 실려 있었다. 그 가운데 한편 「珍島江亭」이란 시의 번역을 보자.
/
行盡林中路 숲속 길 다[와]
時回浦口船 때마침 포구로 돌아오는 배를 [타노니]
水環千里地 물은 천리 땅을 둘렀고
山礙一涯天 산은 수평선을 가로 막았네.
白日孤槎客 한낮에 [배를 탄] 외로운 나그네
青雲上界仙 청운상계(?) 신선만 [같아]
歸來多感淚 돌아온 [자리] 다감한 눈물에 [젖어]
醉墨灑江煙 취한 붓에 [나루터 풍경을 그리노라.] </font>
-고조기, 「진도벽파정(珍島江亭)」전문/
*(번역문 뒤에 원문이 있는 것을, 필자가 임의로 이처럼 옮겼다. 차마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점, 제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괄호]속 말은 눈을 씻고 보아도 원문에 없는 말이다. 또 번역문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부득이다. 문맥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 기가 막혀서 내친 김에 인터넷을 뒤졌다.
/
숲속의 길을 [모조리 밟아 와서] / 行盡林中路
때로 포구의 배를 돌려 [타네] / 時回浦口船
천 리 땅에 물이 삥 둘러 있고 / 水環千里地
하늘 끝을 산이 꽉 막은 [곳] / 山礙一涯天
대낮에 외로운 떼[槎]를 [탄] 나그네는 / 白日孤査客
[청운에 [올랐던] 천상의 신선이었네] / 青雲上界仙
돌아오니 좋은 경(景)에 느낌이 하도 많아 / 歸來多感物
취하여 [시를 읊어서] 강 [바람]에 뿌리네 / 醉墨灑江煙
(출처 http://rla70ghks.blog.me/120164465017)
이건 또, 마구잡이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물론 한시는 글자의 자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평측(平仄)과 각운(脚韻) 때문이지, 문법체계까지 제멋대로인 마구잡이는 아니다. 따라서 번역 또한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친절하게 불필요한 이역은 원작까지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다음을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珍島江亭 / 고조기
行盡林中路 길 다하니 숲속 길인가, *行 : 道理, 또는 ‘벼슬길’
時回浦口船 때 (되면) 배도 포구로 돌아오는데. *時(至)船回浦口의 생략과 도치
水環千里地 물은 천리의 땅을 둘렀고
山碍一涯天 산은 한 하늘 끝을 가로막았네. *天涯의 도치
白日孤槎客 대낮에 외딴 뗏목의 나그네 *槎(楂): 뗏목-사
靑雲上界仙 청운(靑雲之志 청운의 꿈)은 하늘의 신선이더니
歸來多感淚(物) 돌아왔는가, 다감한 눈물에(景物에 감회가 많으니)
醉墨灑江烟 취한 글씨가 강 안개에 씻기네.
*灑(쇄): 뿌리다. 씻다. *醉墨 : 술에 취해 쓴 글씨.
*5언 시로서 운자는 선운先韻의 ‘船·天·仙·烟’이며, 언술형식은 묘사.
[이 번역은 필자]
수련 초구의 '行'은 崇政大夫行李曹判書의 ‘行’과 같다. 崇政大夫는 품계, 行李曹判書는 수행(遂行)한 관직. 그러니까 묘석에 [숭정대부 본관 강공 아무개의 묘]라고 되어 있다면 품계만 있고, 벼슬을 살아보지 못한 위인이란 뜻이다. 따라서 /벼슬길 다하니 숲속 길인가/ 숲길은 아무래도 어둡고 침침하다. 시의 주제를 암시한 이미지이다. 한시, 특히 당시 이후의 시편들은 거개가 말로 하지 않는다. 입상진의(立像盡意, 상을 세워 뜻을 다한다)의 이미지즘을 중시하는 것이 시법이다. 곧 /벼슬길 떨어지니 숲속 길인가(운둔의 길인가), 때가 되면 나갔던 배도 포구로 돌아오는데/이다. 그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한 시구가 다음이다. /물은 천리의 땅을 둘렀고, 산은 한 끝 하늘을 막았네./ 지금 화자는 진도라는 작은 섬에 있다. 귀양살이를 진도에서 했는지, 아니면 제주가 고향이므로 벼슬 떨어지고 제주로 오다가 잠시 머물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섬에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千里地의 천리의 땅’은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즉 한양천리와 같다. 그러니까 벼슬길 다하니 이제 숲속 길인가. 때가 되면 나갔던 배도 포구로 들어오는 법인데, 물은 천릿길을 막았고, 산(政敵)까지 하늘 한 끝(임금의 한 눈)을 가리고 있으니,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다‘는 정황을 경물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先景後情의 先景이고, 이후는 後情, 즉 심상이다.
제주에는 지금도, 작은 떼배를 띄워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 화자는 그 뗏목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의탁하고 있는 시구가 경련과 미련이다. /白日孤槎客/ 여기 槎와 전구의 船이 다 배이므로 화자가 배를 탄 것으로 자칫 혼동하게 된다. 때문에 저런 엉뚱한 번역이 된 것이다. 모두 비유일 뿐이다. /白日孤槎, 대낮에 떠있는 외딴 떼배/ 떼배는 낮아서 밤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낮에, 멀리 가물거리는 떼배를 보면 사람의 모습만 위태하게 보인다. 그처럼 외로운 나그네란 은유이다. 사람은 정치성이 강한 동물로서 어딜 가든 둘 이상만 모였다하면 끼리끼리 모인다. 그리고 거기에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는 지배욕과 소유욕이란 것이 가동하기 마련이다. “고조기”는 제주 사람이다. 고려 인종과 의종 때 사람이므로 제주 출신 벼슬아치가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니 어딜 가든 제주 촌놈으로서 외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白日孤槎客 靑雲上界仙
/대낮에 뜬 외딴 뗏목의 나그네였지만 그 靑雲의 뜻은 하늘(上界)의 신선과 같았다/는 내용이다. 창망한 바다 멀리 가물거리는 뗏목 위에 사람 하나, 넓은 바다는 하늘같을 것이며 그 위에 의연하게 서 있는 그림자는, 마치 신선이 아닐런가. 곧 화자 자신을 경물에 빗댄 말이다. 이제 결구, 즉 미련의 첫구 /歸來多感淚(物)/ 인용한 책에는 ‘淚’인데 인터넷에 올라온 글자는 ‘物’이다. 어느 것이나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歸來’의 來는 어세를 고르게 하거나 영탄의 뜻을 나타내는 허사이다. 도연명의 “歸去來辭”의 來와 같다. 진도에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라, 귀거래사의 그것처럼 ‘벼슬을 놓고 閑居에 돌아왔는가’라는 독백이며 자탄이다. 이와 관련한 시구가 결구, /醉墨灑江烟취묵쇄강연/이다. 고조기는 "성품은 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였고 경사(經史)에 널리 통하였으며 시에도 능숙하였다(인물사전)."라 하고 있다. 이런 성품일수록 눈물이 많다. 하니 '비분강개에 취한 글줄들이 이제 강 안개로 말끔히 씻기고 있다’는 심상을 그려주고 있을 뿐이다. 진도에 江이 있을 리 없으므로 심상의 江, 즉 세월을 말함이다. 그동안 나이가 들었을 것이므로 그런 글줄들이 세월의 강 안개에 점점 씻겨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 시는 모두 경물에 빗댄 비유일 뿐으로 이미지즘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시 같은 외국의 시는 물론이지만 한시 또한 잘 살펴보면 마구잡이식 번역들이 많았다. 같은 시를 다른 책에서 봐도 대동소이하다. 그 번역문이란 것이 대부분 시가 아니라, 그냥 설명일 때가 많다. 특히 ①버젓이 있는 글자를 슬쩍 빼버리고 넘어가거나, ②전혀 아닌 말로 이역하거나, ③시가 아닌 산문으로 설명하거나, ④문법체계를 무시하거나 하는 등, 일천한 필자가 보기에도 그 번역들은 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왜 이런 식일까. 필자가 좋은 책을 보지 못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아무래도 시인이 아닌 일반 학자들의 번역이라서 그리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아니면 한문에 무지한 독자들이 못 이해할까봐 염려해서 그리 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는 시이다. 천 번을 번역한다 해도 시는 시가 되어야만 한다. 산문이 아닌 시이므로 시로써 원작에 가깝게만 번역하면 그뿐이다. 그것을 읽는 독자가 이해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문제는 독자 나름이다. 번역자가 친절하게도 그것까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어차피 시라는 것은, 마치 수석 한 점을 놓고 보는 것과 같아서, 이리 보면 저것 같고, 저리 보면 이것 같아 보인다. 그게 시이다. 그래서 필자는 시를 괴물이라고도 한다. 다의적인 시는 볼 때마다 그 스스로 변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독자의 오역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번역자가, 혹은 작가라 해도 그것까지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누구는 거기에서 나뭇잎 하나를 따고 갈 것이고, 누구는 그 시를 보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간다고 해도 좋은 것이다. 작가로서는 그 자체로서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다. 하니 그 어떤 나랏말의 시라고 해도 그 번역은 최대한 원작에 가깝게 시로써 번역만 하면 된다. 굳이 더 설명하고 싶다면 장을 달리해서 말하면 된다. 어디까지나 그런 설명도 자기 생각이므로 한 소견에 불과한 것이다. 곧 번역자라 해도 원작자가 아닌 이상, 한 독자와 다름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
*고조기(高兆基 ? ~ 1157 (고려 의종 11. 본관 濟州. 호 鷄林) : 고려시대 인종, 의종 때의 문신. 이자겸 실각 후 봉우를 탄핵하다가, 좌천되었다. 대관으로, 이자겸의 난 때 동조한 조신들의 파직을 상소하다가 예부낭중으로 전직되었다(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