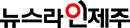‘상사화(相思花)는 여자와 남자다, 꽃은 잎을 그리워하다 지고, 잎은 꽃을 그리워하다 지는, 꽃의 기다림으로 눈은 더 넓게 열리고, 잎의 기다림으로 귀는 더 깊게 열리는, 붉은 영혼의 빛들이 날아와 훨훨 춤추는 내 마음의 뜰, 상사화는 이룰 수 없는 절름발이 사랑이다, 외눈박이 사랑이다, 불완전하면서 가장 완전한 사랑이다’
상사화(相思花)
문 상 금
세상에는 상사화(相思花)란 꽃도 있다지요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
꽃 모양도 색깔도
통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상사화 꽃이 피었어요
불현듯 걸려온 목소리에
그렁그렁 걸려있는
꽃 같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한라산 중산간(中山間)에서 만났던
폭우(暴雨) 꽃잎을 보았습니다
온통 무채색(無彩色)인 그것은
빗발에 온몸이 해어지고
내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괜찮을 꽃이었습니다
향(香)은 아마도 짙은 땀 냄새가 나겠지요
상사화(相思花)는 아마,
아마 그런 꽃인 모양이지요
-제3시집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있기 때문이다」에 수록

1990년대 초, 서귀포문학에 발표된 현주하 시인의 ‘상사화’라는 시를 읽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상사화란 꽃을 잘 몰랐다, 꽃도 예쁘고 잎도 곱다는데, 꽃은 어떤 색깔일까 잎은 어떤 모양일까, 봄에 뾰족뾰족 돋아난 잎이 다 지고 나면 여름 끝에 꽃대가 솟고 찬란히 피어난다는 상사화, 남녀의 이룰 수 없는 사랑처럼 천연히 슬픔의 냄새가 폴폴 날 것 같은 꽃.
절물휴양림을 거닐던 지인(知人)이 불현듯, 호들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다, ‘어떡해, 어떡해, 상사화 꽃이 피었어요, 꽃대가 쑥쑥 올라 왔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꽃이 폈겠지’, 지금 같으면 인증 샷을 보내라 하겠지만, 아마, 좀 예쁜 꽃인가 보다, 신비로운 꽃인가 보다, 저리 호들갑스러운 걸 보면, 그리곤 잊어버렸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흥분되고 떨리는 것 같은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귓전을 맴도는 것이었다, 꽃 모양도 꽃 색깔도 그 향도 잘 모르면서, 나는 ‘상사화’라고 떡 제목을 써놓고 시를 쓰기 시작했다, 상사화가 그 당시 나에게는 꼭 사람이 꽃으로 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꽃모양은 아마 사람이 팔을 벌린 모습일까, 꽃 색깔은 아마 살짝 타듯이 진한 살색일까, 꽃의 향기는 아마도 짙은 땀 냄새 일까, 상사화(相思花)는 아마, 아마 사람을 닮은 그런 꽃인가 보다, 그렇게 시를 썼다. 여태껏 상사화에 대한 시를 네 편 썼는데, 위에 시는 실제로 상사화를 보기 이전에 오로지 상상만으로 쓴 시라 할 수 있다.
길상사(吉祥寺를)를 갔다, 한가한 연못엔 연밥이 가을 햇볕에 잘 마르고 있었다, 그 연못을 건너자마자, 마치 붉은 영혼의 빛들이 날아와 훨훨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꽃무리를 만났다,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어떡해, 어떡해, 바로 상사화로구나, 백석 시인과 기생 자야가, 흰 당나귀와 나타샤가 왔구나, 천 억 보다 더 값진 시(詩)한 줄을 품고, 오랜 세월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다가, 꽃으로 피어난 거로구나, 비로소 알았다, 상사화 붉은 꽃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흥분되고 떨리고 호들갑스러워진다는 것을.
자야의 본명은 김영한이며 기생명은 김진향이었다, 1936년 함흥관 연회에서 만났을 때 둘은 첫 눈에 반하였다 하며 백석 시인은 이백의 시 자야오가(子夜吳歌)를 떠올려 김진향을 자야(子夜)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짧고 깊은 사랑을 하였다, 자야는 홀로 평생을 모운 천억 원 상당의 요정 대원각을 법정스님한테로 시주 받아 주십사 간절히 요청을 올렸고, 법정스님은 몇 번의 물리침 끝에 그 시주를 받아들여, 1997년 길상사(吉祥寺)라는 절을 창건하게 된다. 자야는 염주 하나와 길상화(吉詳花)라는 법명을 받았다.
후일 자야는 회고록에서 말한다, ‘그까짓 천억 원, 그 사람 시(詩) 한 줄만 못해! 다시 태어나면 나도 시를 쓸 거야’ ‘나는 지금도 그 젊은 시절의 백석을 꿈에서 자주 봅니다, 내 나이 어언 일흔셋, 홍안은 사라지고 머리는 파뿌리가 되었지만, 지난날 백석과 함께 살던 그 시절의 추억은 아직도 내 생애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은 추호도 이해로 얽혀 있지 않았고 오직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야는 대원각 시주에 이어 카이스트(KAIST)에도 122억 원을 출연했다. 또 출판사 ‘창작과 비평’에도 2억 원을 출연하여 ‘백석 문학상’을 제정했다. 황지우 시인, 안도현 시인, 도종환 시인, 나희덕 시인 등이 이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1999년 자야가 세상을 뜨자 화장을 하고 길상사 경내에 뿌려졌다. 흰 눈이 펄펄 내리던 겨울날, 순백의 길상사 뒤편 언덕에서, 흰 당나귀 타고 평생 그리워하던 연인, 백석의 곁으로 돌아간 것이다.
백석 시인과 자야의 인연은 아마도 국수발처럼 가늘고 길게 혹은 이어졌다 갈라지는 시골길처럼 때로 잠시 멈췄다 이어지곤 하는, 거칠고 짙은 인연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 길 끝에는 따뜻한 저녁밥 짓는 푸른 연기가 솟아오르고, 꼭 껴안고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이중섭 미술관 작은 텃밭에서 길상사에서 만났던 붉은 상사화를 만났다, 영광 불갑사(佛甲寺)인근에서 가져온 상사화라고 했다, 몇 뿌리 얻어다가 뒷마당에 꼭꼭 심어 주었다, 해가 바뀌고 작은 창으로 무언가 빛 같은 것이 어른거렸다. 아아, 잎 지고 꽃 피었는가, 춤추듯 흔들리고 있는 붉은 꽃들, 붉은 목숨들, 붉은 사랑들, 숨죽여, 안으로 품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완전해지는 사랑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아니, 무리지은 남녀가 춤을 추고 있는 듯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살랑살랑 흔들려, 꽃들은 사랑을 하였다, 춤추는 꽃 그림자가 자꾸만 겹쳐졌다, 내 마음에도 그리움의 바람이 불 때마다, 꽃술은 꽃잎은 꽃대는 흔들려, 갈수록 짙은 향기를 땀 냄새를 폴폴 풍겼다, 상사화는 아마, 아마 그런 사람 꽃인 모양이지요.
백석 시인은 자야의 그 길고 진한 사랑을 알고 있었을까, 혹 알았다면 기뻤을까, 슬펐을까, 고마웠을까, 세상의 길 끝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소주(燒酒)를 마셨을까.
자야는 꽃으로 태어났을까, 상사화로 피어났을까, 이 곳 서귀포에서 환생(幻生)한다면, 같이 시를 얘기하고 시를 써 봐도 참 좋으련만.
지금도 나는 상사화를 사람 꽃이라 부른다. [글 문상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