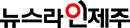‘자리젓은 입맛 잃은 한여름, 별미다. 푹 삭은 자리 한 마리면, 밥 한 공기가 뚝딱 넘어간다, 물외 냉국에 콩잎 몇 장 곁들여 여름(열매)을 음미하며, 여름을 또 이겨낸다, 자리젓은 그리움이다, 익을 대로 푹 무르익은 그리움이다, 늘 먹먹한 가슴인 채로 절여지다가도, 곧장 지느러미와 꼬리 털고, 짙푸른 바다 물길을 씽씽 헤엄쳐가곤 하는, 애타도록 사무치는 목숨의 순간이동이다,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기꺼이 너의 그리움의 바다가 되어 주마’
자리젓
문상금
곰삭은
자리젓
입맛 없어
점심에 밥 비벼
먹었는데
제법 맛있게
잘 먹었는데
물을
한 말을 들이켰다
잘 익은
자리 한 마리
삭고 삭아 젓갈 되었어도
바다가 그리웠나 보다
한 말 물속에서
되살아나 씽씽 헤엄치고 있다
어느새 나는 짙푸른 바다가 되어
맛있게 먹은 죄(罪)로
자리 한 마리를 품고 있다
-제5시집 「첫사랑」에 수록

가끔 서울에서 시인들이 오거나 제주 시인들의 시집이 출판되거나 하면 자리물회를 먹으러 보목포구로 간다. 섶섬 한 번 바라보다가 잔물결 큰 물결 이는 바다 한 번 바라보다가, 흰 파도에 놀라 요란하게 날아오르는 물까마귀를 한참을 바라다보며, 자리의 그 담백하고 배지근한 속살의 맛을 음미하곤 한다.
자리구이나 자리젓도 좋아하지만, 자리강회를 자근자근 씹어 먹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자리젓은 가끔 입맛을 잃을 때 먹곤 한다. 특히 자리젓은 아주아주 푹 곰삭은 것을 좋아한다, 살이 다 녹아내려 진국이 된 젓갈을 따뜻한 밥 위에 척 올려놓고 조금씩 먹다보면 어느새 밥 한 공기가 뚝딱 비워진다, 자리젓국을 보글보글 끓여먹기도 한다, 뚝배기 그릇에 자리젓갈 서너 마리를 넣고 청양 고추며 마늘이며 대파를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자박자박 잘 졸여져서 콩잎이나 상추에 혹은 삶은 호박잎에 척 올려놓고 먹는 맛이 가히 일품이다.
어머니는 해마다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철이면 자리젓을 담그셨다, 어디선가 ‘자 ~ 리, 자리 삽 ~ 써’하는 자리장수가 나타나면, 한 양푼 자리를 사서는 굵은 소금으로 버무려 곧장 작은 항아리에다 넣고 그 위에 왕소금을 두텁게 덮고는 손으로 꼭꼭 눌러주고 천으로 항아리를 덮고 고무줄로 고정해서 헛부엌 한 쪽에 놓아두시곤 하셨다.
별 관심도 없는가보다 하고 있으면 어느 한 여름날, 그냥 맨몸인 자리젓도 밥상에 오르고 또 갖은 양념을 한 자리젓이 등장하는가 하면 좀 있다가는 푹 삭은 자리로 끓인 자리젓국이 상에 오르곤 했다, 아마도 어머니 손은 어림짐작으로 간을 해도 척척 맛이 일등인, 마술 요리사 손인 것 같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언젠가 나도 그 기억들을 찬찬히 생각하며, 보목포구에 가서 잔잔한 자리를 두 됫박 사고 와서, 일부는 자리강회를 만들어 먹고 일부는 항아리에 넣고, 그 심해의 푸른 비늘 사이로 왕소금을 듬뿍 덮어주고 천과 검은 고무줄로 항아리를 동여매고 서늘한 곳에 놓아두었다, 한두 달 정도 잊어버렸다가 날씨 좋은 날 열어보니, 푹 삭긴 했는데, 너무 짠 것이 탈이었다, 그래도 그런대로 맛은 있어서, 밥 먹을 때마다 한두 마리씩 꺼내먹었다.
제법 맛있게 잘 먹었는데, 물 한 말을 벌컥 들이켰다, 그러자 너무나 잘 익은 자리 한 마리, 삭고 삭아 진한 국물이 되었는데도, 그 푸른 바다가 그리워, 그 짙푸른 바다가 그리워, 씽씽 되살아나, 뱃속을 헤엄쳐 다니기 시작하였다. 내 몸 어디선가는 짠 바닷가 바람이 출렁이더니, 흰 물결을 타고, 웬 피리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다.
끝내 삭지 않은, 등뼈 하나 물고, 길고 긴 바람 소리, 뼈 피리 소리 삘릴리~ 삘릴리~
내 등을 타고, 큰 물결로 때로 잔물결로 파르르 떠는 비늘, 오, 서늘한, 뼈 피리 소리.
맛있게 먹은 죄(罪)로, 기꺼이 넓고 깊은 짙푸른 바다가 되어 주마, 마음껏 헤엄치거라.
삭고 삭아 진토(塵土)가 되고 젓갈이 될지라도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 세상 끝까지, 적토마처럼 밤새 달려가 멈출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장무상망(長毋相忘),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 세한도에 붉은 인장으로 찍힌 말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진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약속했던 것들도 곧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정말 살아남았다, 추사와 그의 제자 이상적이 나누었던 절절한 마음과 그리움은 ‘추사(秋史) 김정희필(金正喜筆) 세한도(歲寒圖)’라는 명작으로 탄생하였다.
제주에서 귀양살이(1844년, 당시 59세)할 때, 어쩌면 가장 고난의 시기에, 좋은 책 몇 권을 보내온 제자에게 추사는 세한도를 그려 보내면서, 조용히 그 힘들고 애절한 마음을 속으로 다스리지 않았던가. 세한(歲寒)은 겨울에 홀로 푸른 소나무를 말함이다.
가장 먼 곳이, 손도 발도 아니고 바로 가슴이라 하였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무려 칠십년이 걸렸다고 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고백(告白)이, 마치 내 고백처럼 부끄러운 날도 있었지.
품고 있는 것이 어디 자리 한 마리뿐이랴, 그리움뿐이랴. 밤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소중한 무엇 무엇들, 그것들을 따뜻한 품에 안고 기억하며 그 온기를 키우며, 이 세상을 견디고 또한 이 여름을 견디는 것이려니!
장무상망(長毋相忘),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아요!’
물망초의 꽃말은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오래도록, 부디, 죽어서라도 꼭 기억해주기를,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애절한 말들.
인장(印章)으로나 콱 찍힐, 그 붉은 그리움들을, 죄 끌어 모아 나는 시(詩)를 쓰고 또 쓴다. [글 문상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