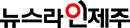‘마방목지에서는 말들이 뛰어놀고, 시방목지에서는 무수한 시(詩)들이 뛰어논다, 자유로운 듯 자유롭지 않은 듯, 날렵한 몸짓의 그것들은 거침이 없고 순수함 그 자체다, ‘자작시에 대한 해설이나 스토리를 쓰고 싶은 대로 써주세요’, ‘점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싣겠다’는 말이 너무나 고마워서, 마음에 들어서, 나는 매주 시방목지를 쓴다.’
고수목마(古藪牧馬)에서
문상금
한라산은 무엇이 그리 그리워서
자신의 중턱에다 풀밭을
탁 풀어 놓았는지
날렵한 말들이
줄달음치는 이 곳에서
나도 한 마리 말이 되리라
내 몸엔 아직도
유목민의 뜨거운 피가 흘러
따뜻한 별들이 별빛을
붉은 피처럼 흘려보내는 밤이면
풀밭의 말떼들과
한바탕 질주를 하리라
생 비린내 나는 풀밭을
질주하다질주하다
편자가 다 닳아져
하얗게 쓰러지는 밤이면
밤새워 시(詩)를 쓰리라
한라산 중턱
별이 쏟아지는
고수목마(古藪牧馬)
지붕이 낮은 천막에서
한라산이 탁 풀어놓은
그리움이란 그리움
모두 스러질 때까지
-제5시집 「첫사랑」에 수록

나는 자칭 타칭 서귀포 붙박이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귀포 반경에서 다람쥐 쳇바퀴 따라 돌듯, 맴돌며 살아간다, 사람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 몇몇하고만 어울리며 살아간다, 거의 꼭꼭 숨어 살아간다, 그래도 동네 아이들부터 할머니까지 알아봐 주는 사람들도 많고, 안녕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어찌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아주 많다, 제주 사람들도 많지만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이주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카톡 친구가 매일 늘어난다, 참 신통방통한 일이다. 아마 나에게는 강한 ‘이끌림’이나 ‘끌어당김’의 에너지를 많이 품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올 유월 초에 거의 삼년 만에 제주시 노형동에, 오승철 시조시인 아들 결혼이 있어서 몇몇 문우들과 다녀왔다, 오승철 시인은 서귀포에서 여러 번 얼굴을 보곤 하지만, 신랑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빛나는 얼굴일지 엿보고 싶어서 꼭 가보고 싶었던 것이다.
가슴에 꽃을 꽂고 살짝 화장을 하였는지 땀이 났는지 반짝이고 화사해 보여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역시 여자든 남자든 거무스름한 것 보다는 단정하고 흰 얼굴이 훨씬 나아 보인다, 식사자리가 끝나자 강순복 동화작가가 사준 짙은 커피와 치즈 케잌이 너무 맛있어, 잔치 먹으러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제주 문우들의 얼굴들이 너무 반가웠다, 벌써 등단 30년이 넘어가고 있다, 허리까지 긴 머리, 흰 얼굴에,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었지, 눈만 반짝거렸었지, 이제는 말만 늘어, 거의 십 년 만에 만난 조영자 시인과 강애심 시인한테 작품 많이 써야 된다고, 발표 많이 해야 한다고 잔칫집에서 반가움을 또 지랄 같은 오지랖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한라산을 오고가는 시간에 보았던 나무들의 푸름과 신록의 숲 터널도 인상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마방목지 넓은 목초지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거나 뛰어노는 말들이 너무 보기 좋았다. 실은 나는 이 풍경을 예전부터 아주 좋아했고 즐기는 편이었다, 그래서 집필해 주기를 부탁받았을 때, 마방목지에서 살짝 힌트를 받아 ‘문상금의 시방목지’로 표제(表題)를 정하게 된 것이다.
나는 말띠다, 그것도 백말 띠다, 어릴 적,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이름을 날리면 된다고 하였다, 나는 내 이름 석 자를 아주 좋아한다, 文祥今, ‘지금 이 순간이 최고로구나, 상서로운 복이 머물고 있는 지금이로구나!’ 청석 변영탁 선생님이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신 다음부터는 나도 따라 큰 소리로 불러주곤 한다, ‘상금, 상금, 문상금’
서귀포 붙박이면서도 역마살이 꼈는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엄청 좋아하는 편이다, 특히 밤낮 나무나 꽃이나 바위나 바닷가나, 새벽 첫 차의 모습이나, 서귀포에서 가장 일찍 문을 여는 빵집이나 김밥가게 불빛들을 찾아 곳곳을 돌아다니는 편이다. 혹시 유목민의 붉은 피가 나한테도 DNA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유목민이라고 하니 문득 현용식 시인이 떠오른다, 그리고 현용식 시인하면 늘 천막이 떠오른다, 내가 서귀포문인협회 회장을 할 때 돈내코 야영지로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다, 서넛이 우르르 달려갔는데, 참 생소하였다, 천막 세 동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엌, 하나는 거실 또 하나는 침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집도 두 채나 있다 하면서 벌써 몇 년 째, 천막에서 생활한다 하였다, 낚시해 온 따치 생선을 썰어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팔팔 끓인 매운탕과 삼겹살 구이가 일품이었다, ‘혹시 역마살이 있나요?’ 물으니, ‘아마도 몽골의 피가 몸속에 흐르고 있나 봐요, 이런 천막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럴지도 모른다, 제주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지 않은가, 그것도 백여 년 가량이나, 짓밟힌 아낙들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몰래몰래 태어난 아이들은 제주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유목(遊牧)의 붉은 피는 꿈틀대고 있지 않았을까.
한 남자가 꽃밭을 만들고 있었다, 땀에 젖은 뒷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돌담을 쌓아, 꽃밭을 나누어보면 어떨까요?’ ‘드넓은 것이 좋습니다,’ 그랬다, 넓은 것하고 드넓은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드’라는 한 글자가 들어갔을 뿐인데도, 엄청나게 넓은 꽃밭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아니야, 제주사람들에게도 화전과 유목이란 것이 있었지, 쇠테우리 말테우리가 있었지, 그 척박했던 시절들, 상흔처럼, 화전민의 집터들이 시커먼 그을음으로 어딘가 남아 있곤 했었지, 봄이면 집에서 기르던 소를 한라산으로 올려 보냈었지, 몇 달 후에 소를 찾으러 나갔던 날, 돈내코를 지나 수악교 냇가에서 기어이 잘린 소머리를 찾아내었다지, 파리 떼 들끓고, 채 감기지 않은 두 눈 사이로 흘러내려 굳은 눈물자국들, 산사람들이 산에 놓아기르는 소를 한 마리 잡아, 고기와 뼈는 전부 갖고 가고 달랑 소머리만 바위 위에 남겨놓고 가버렸다지, 몇 번 들어도 가슴 한 쪽이 늘 저려온다, ‘머리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 알 수 있지, 척, 한 눈에 알 수 있었지, 바로 우리집 소라는 것을, 그 불쌍한 것이’ 아윤 선생은 소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지금도 눈물을 글썽이신다.
아아, 그 보지도 못한, 말로만 들었던, 그 순한 소의 그렁그렁한 눈망울과 끈적끈적한 피눈물자국을 생각하며 내 눈에도 눈물이 흐른다.
나도 한라산 중턱, 별이 쏟아지는 고수목마(古藪牧馬)의 지붕이 낮은 천막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다, 밤새워 시를 쓰다가, 아니 시를 못 쓴들 어떠랴, 한 마리 말이 되어, 따뜻한 별들이 별빛을 붉은 피처럼 흘려보내는 밤이면, 한바탕 질주해 보리라, 편자가 다 닳아질 때까지, 그리움이 다 스러질 때까지 [글 문상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