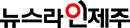‘허물은 잘못이고 또 다른 의미는 탈피한 껍질이다, 그 껍질은 죽음이고 변형이고 고통이며 큰 슬픔이다,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관계가 끝나거나 이동하는 시기이며 재탄생을 뜻한다, 기존의 사고의 틀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끊임없는 변화와 변형, 새로운 것을 위하여 과거를 제거하는 것이며 익숙한 상황과의 종결이며 또 다른 삶을 위하여 내딛는 첫걸음이다’
꽃뱀
문상금
그대 우는 걸 보았지
자주 감자 꽃 같은 울음
치렁치렁 달고
오랜 설움 안으로 안으로만
삭여온 녹슨 종처럼
동백 나뭇가지 사이로
섬뜩 빛살 날리는
그늘 속 숨어들어
어둠이 되는
꽃
-제1시집 「겨울나무」에 수록

구렁이를 나는 꽃뱀이라 불렀다, 우글우글, 열 살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살게 되었던 법환 집은 골목이 길다 못해 기역자로 꺾어 들어가야 마당이 있었던 아주 규모가 큰 초가집이었다. 1960년도에 발매된 삼다도소식 이라는 노래에는 ‘삼다도라 제주에는 ~ 아가씨도 많은데 ~ 미역을 따오리까 소라를 딸까 ~ 달빛이 새어드는 연자방앗간’이란 가사처럼 정말 연자방아도 있었다.
방마다 마루마다 굴무기(제주 느티나무)로 만든 큰 궤짝들이 열 두 개 정도 있었는데, 그 열쇠꾸러미가 한 짐이라 무거우면서도 또 쇠 부딪치는 마찰음 소리가 좋아서 수시로 들고 다니다 부모님께 야단을 맞곤 했다. 앞뒤로 넓은 귤밭과 텃밭이 있었고, 특히 집 뒤꼍 서쪽에는 생전 처음 보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있었다. 한 평 남짓한 네모난 돌로 촘촘히 담이 둘러쳐져 있었는데, 그 속에 풀로 덮어놓은 작은 탑 같은 것이 있었다.
앞마당 오래된 감나무 밑에서 감꽃을 줍다가 심심하면, 뒤꼍 돌담위로 올라가 마치 어릿광대가 줄을 타듯 돌담을 타고 놀았는데, 그 네모난 촘촘한 돌담 있는 곳으로 가면 괜히 섬뜩해졌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봄이 지나고 풋감 따는 여름이 다 오도록 무슨 탑인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돌담 사이 구멍에서 햇빛에 반짝 빛살 날리는 뱀 대가리를 발견하였다, 악, 하고 얼어붙는 사이에 갈색 바탕 위에 또 짙은 갈색 무늬 꽃 옷을 입은 그것은, 스르르 내가 서있는 곳까지 나오는 것이었다. 엄청 굵은 구렁이 아니 꽃뱀이었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오신 어머니는 얼른 안아 눈을 가리며, 뒤꼍에서는 다신 놀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셨던 어머니와 어린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둡고 두려웠던 공간인, 바로 그것은 ‘밧칠성’과 ‘칠성눌’이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제주에는 풍년을 들게 하고 부(富)를 일으키는 뱀 신인 ‘칠성’을 모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곡식을 저장하는 방인 ‘고팡(庫房)’에 모시는 칠성을 ‘안칠성’이라 하였고, 집 뒤 장독 곁에 모시는 것을 ‘밧칠성’이라 하였다.
‘밧칠성’은 땅 위에 기왓장을 깔고 그 위에 오곡(五穀)의 씨를 놓은 뒤,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주저리(볏짚이나 보리 짚의 끝을 모아 엮어서 무엇을 씌울 수 있도록 만든 물건)를 덮어 모시는데, 이를 ‘칠성눌’이라 하였다. 내가 이상하게 섬뜩함을 느꼈던 그 곳은 바로 뱀을 모셔놓은 칠성눌이었던 것이다.
그늘 속 어둠이었던 꽃뱀은 결국 풍년과 부를 일으키는 엄청난 에너자이저(energize,활력을 주는 사람이나 물건)이자 곧 신(神)이었다니, 그 신들에 둘러싸여 내 열 살은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나무며 돌담을 타고 놀았다니.
그동안 직접 만나지만 못했을 뿐이지, 꽃뱀들은 안마당 뒷마당 돌담 구멍마다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름에는 온통 나무문들을 열어놓고 지냈는데, 아침밥을 먹다 뒷문을 바라보면 두세 마리가 엉켜 놀고 있었고, 넓은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다가 깨어날 때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머리 위 천장에 또 두세 마리가 미동도 없이 착 달라붙어 있곤 하였다.
그것들과 차츰 익숙해졌고 조금씩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래도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나는 낮잠에서 깨자마자 곧장 뒷마당 대나무밭으로 가서 장대를 꺾어다 나뭇가지를 꽃뱀 있는 곳에 대고 살살 간질이며 빙글빙글 돌리면 그것들은 잎사귀에 둥그렇게 감겨 또 꼼짝을 안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후다닥 나뭇가지를 들고 앞마당 감나무와 동백나무 있는 곳으로 가서 탁 던지면 꽃뱀들은 그제야 스르르 또 돌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왈종 미술관 일을 도울 때도 꽃밭을 가로질러 나와 벽을 타고 오르는 꽃뱀들을 가끔 볼 수 있었는데, 갈색이 아니라 황금색을 띠고 엷은 무늬가 들어가 있었다. 화백님하고 사모님한테 꽃뱀을 보았다고 말씀드렸더니, 사모님이 ‘굵던가요? 어떤 색깔이던가요?’ 하셔서 ‘황금색에 아주 굵었고 활발하게 움직여 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하니까, 아주 좋아하셨다. 그리곤 다시 미술관 벽을 타고 내려와 꽃밭으로 돌아가라고 왕소금 같은 명반을 무더기로 깔아놓았다.
그런 기억 탓일까, 우리 집 뒷마당 잡초가 무성한 곳, 가시덤불에, 가끔 허연 뱀허물이 걸려 바람에 펄럭일 때는, 가만히 다가가 바라다보곤 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늘 속 어딘가에 있을 그것들에게 ‘안녕’ 하고 인사를 한다.
뱀들은 몸집이 자라면서 허물을 벗어야만 한다, 또 상처를 입었을 때도 허물을 벗게 된다, 그러고 보면 허물은 일종의 보호막, 피부 또는 옷인 것이다, 보통 어린 새끼들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1년에 15번 정도 허물을 벗고 다 큰 성체인 뱀은 1년에 1번에서 8번 정도 허물을 벗는다고 한다. 허물은 보통 바위나 돌 또는 거친 나뭇가지에 몸을 비비며 처절한 몸부림으로 울부짖으며 벗게 되는 것이다. 갓 허물을 벗고 흰 뼈를 들어낸 그것들을 상상해보라, 목숨 걸고 재탄생을 향한 그 지난(至難)한 첫걸음은, 언제나 경건하다 못해 눈물이 다 난다.
사람도 허물을 벗는다, 28일을 주기로 피부(skin)의 때가, 얇은 보호막이 벗겨진다, 그래서 보호막인 때를 박박 밀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세포들은 자라나고 각질층을 유지하다 또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뱀은 불규칙으로 허물을 벗고 사람들은 여성의 생리처럼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는 것이다.
채 지지 못한 달이 허옇게 떠있는 하늘에는, 가끔 펄럭펄럭 뱀 허물, 아무도 없는 빈 집을 지키고 있어, 나도 뱀처럼 허연 허물을 벗고 싶다, 가시나무에 몸통 꽂은 채, 이리저리 몸부림치다, 쫙 허물을 벗겨내고 싶다, 훈장처럼 빛나는 허물을, 가시나무 구름에 걸어놓고 오래도록 펄럭이고 싶다, 낮에도 지지 못해 그리움의 긴 꼬리 늘어뜨린, 저기 저 하현(下弦)처럼, 그리움도 허물도 다 목숨 거는 일임을
너는 아느냐,
너는 나에게 유일한 신(神)이라는 것을 아느냐, 기쁨이고 행복이고 활력이라는 것을 아느냐.
너에게 나는 아직도 그늘인 것이냐, 짙은 갈색 꽃인 채로 정녕 그늘인 것이냐, 스스로 가슴을 치고 돌아눕는, 그늘 속, 숨어드는 어둠인 것이냐.
그리하여 섬뜩, 빛살 날리는 것이냐. [글 문상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