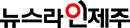‘거칠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다, 당당하다는 것이다. 잘 살았다는 것이다. 돌매화와 시인은 한 몸이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무와 꽃이 되어, 악착같이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고 시를 쓰고 때로 큰 함성 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한라산 암매(巖梅)
문 상 금
때로 거칠어야 기죽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무야,
이처럼 고운 꽃아,
결국 살아간다는 것은
고행(苦行)의 길
피투성이 되어 암벽을 오르내리는 일
그 아찔한 높이에서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려야만
꽃을 피우고 잎도 틔울 수 있는 일
별무리 쏟아지는 밤이면
온 몸 열고 세상 향해 큰 함성 지룰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아니 가장 큰 나무야,
돌매화야,
나는 매일
피투성이인 채로
한라산 암벽을 오르내린다.
- 제4시집 <꽃에 미친 女子>에 수록

아마 늦봄은 장미꽃에서 시작하는 것일 것이다. 담벼락을 칭칭 타고 오르는 그 몸짓 혹은 어느 적막한 깊은 골짜기 바위 사이로 피고 지는 그 처절한 몸부림, 그 향(香)이 짙게 떠오른다. 여기서 떠오른다는 표현은 지금 내가 그윽하게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붉디붉게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장미꽃을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만져보지 않아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수줍게 열리는 꽃잎들 사이 스멀스멀 번져오는 향기까지 맡을 수 있음이다.
언제부턴가 그랬다. 하루에 서너 차례 바다로 줄달음쳐야 숨통이 트이곤 했었던 날들이 아마 오십 평생에 절반은 넘을 것이다. 그리고 꽃을 보러 사시사철 밤낮으로 들판을 휘젓고 다녔던 것이 일상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딱 끊었다. 바다도 보지 않고 꽃도 보지 않아도 내 마음의 밭에는 흰 파도와 거친 물결들이 출렁거렸으며 온갖 꽃들이 피어났다 떨어지곤 하였다.
넓은 유리창을 아주 좋아한다. 유리창을 가만히 바라보며 응시하고 있노라면 사계절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새벽이슬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 그 햇살들은 긴 다리를 뻗어 유리창을 줄기세포처럼 파고든다. 비바람이 치거나 눈이 내릴 때 유리창을 통해 본 가로등 불빛의 풍경도 가히 인상적이다. 불빛에 춤을 추는 비와 눈과 바람의 흔적들은 흡사 피투성이 되도록 밤새 한라산 암벽에 뿌리 내리는 작은 꽃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닮았다.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는 저녁의 모습도 참 아름답다. 먼저 연보라색 어둠의 한 자락이 거리로 내리기 시작하고 그 위로 또 회색빛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짐을 느낀다. 빨간 열매의 먼 나무 위로 강아지 위로 자유자재로 걸어가는 사람들 어깨 위로 검은 어둠이 하나둘 눈송이처럼 내리더니 금방 사방은 깜깜해졌다. 맑고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들은 어제의 풍경 같기도 하고 혹 내일의 풍경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곤 한다.
항상 메모를 한다. 아니 쉴 새 없이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게다. 그 기록한 것들은 하나둘 시로 태어나 세상으로 나간다. 매번 봄은 눈부시고 슬프다. 그런 봄을 오롯 맞이하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봄 가운데에서 깨알 같은 응어리들을 적어보곤 한다.
“아직은 쌀쌀하다. 그래도 내 마음엔 이미 봄이 와 있다. 홍매 꽃잎이 새끼손톱만큼 하다가 엄지손톱만큼 커지더니 온 몸을 열어 붉은 울음 같은 꽃잎들을 일제히 터뜨렸다.”
“꽃말은 천상의 꽃, 한라산 암벽에 뿌리내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멸종위기식물인 상록관목이다. 봄을 견디고 여름에야 비로소 흰 꽃을 피운다. 참 좋겠다. 밤마다 쏟아지는 별무리 실컷 볼 수 있으니, 오름만큼이나 가슴 속에 묻어 놓은 수만의 말들, 크게 함성이라도 지룰 수 있으니......”
“금방 지은 곤밥(흰 쌀밥)의 냄새, 깊게 들이마신다. 젖과 살과 땀이 뒤범벅된 이것들은 어머니의 냄새다. 그립다, 참 그립다. 양가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셔서 나는 천애 고아다. 아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 뚜벅 뚜벅 걸어간다. 세상 속으로, 선명한 푸른 별 하나 응시하며 이 우주의 중심에 나는 우뚝 서 있다.”
꽃과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중간에 나는 시를 썼다. 그리고 봄이 다 가기 전에 또다시 어김없이 돌아온 늦봄에 나는 중앙 문단 심상지에 ‘홍매’ ‘한라산 암매(巖梅)’ 그리고 ‘곤밥’ 신작시 세 편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 ‘한라산 암매’는 시낭송 하시는 분들이 자주 낭송하는 시라서 더 애정이 간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는 ‘바닷가의 묘지’란 시에서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라고 노래하였다. 여기서 바람은 거친 바람일까 부드러운 바람일까, 아니면 큰 시련일까 작은 시련일까, 피투성이 되어 한라산 암벽을 오르내리는 것 같은 고행(苦行)일까.
살아야 할 이유는 참 많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친구가 있어서, 세 그루 뒷마당에 갓 심은 하귤 묘목을 돌봐야 해서, 나의 흑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시(詩)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의 집을 지어 시집을 상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과 당당히 맞서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먼 훗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또 한 편의 시가 안 남은들 어쩌겠는가, 피고 지는 숱한 꽃들처럼 태어났다 숙명(宿命)처럼 시를 짓고 고행(苦行)처럼 시를 짓고 그리고 동백꽃처럼 어느 아름다운 봄날, 툭 목숨 지기도 하는 것이다.[글 문상금 시인]